
흔히들 명절에 가족들끼리 정치 이야기를 했다가 크게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그러나 명절마다 이번만은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여전히 그런 말이 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생각해 보면 같이 먹고 자고 하던 시절로부터 짧게는 십수 년, 길게는 수십 년이 지난 친척들끼리 서로의 삶에 대해 듬성듬성 구멍 난 기억을 안고 서로의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뉴스 머리기사를 장식한 자극적인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차라리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친척들끼리 시작한 정치 이야기는 고성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그 끝이 씁쓸한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정치 이야기가 내 삶과는 괴리된 허상에 관한 이야기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피붙이들과도 요즘 고민이 무엇인지, 팍팍한 삶을 견딜 힘은 어디서 얻는지, 직장에서 어떤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등 우리가 처한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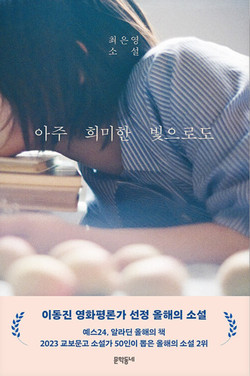
명절에 각 가정을 배회하는 정치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타인과 나누지 않기로 한 결정 즉, ‘방화문을 닫듯이 마음을 닫아버려 차라리 마음의 불길로부터 안전(258쪽)’해지길 선택한 결과이다.
이렇듯 타인에게 마음을 닫아건 우리 사회에서, 소설가 최은영은 등단 이후 계속해서 닫힌 문에 작은 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여름 출간된 작가의 세 번째 소설집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에서는 늘 거기 있는 것이 당연한 존재, 그래서 배경이 되어버려 주목받지 못한 이들의 사연을 통해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표제작인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에서는 비정규직 은행원으로 일하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희원의 시선으로 멋있어 보였지만 사실은 위태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시간강사 ‘그녀’의 이야기를 말한다. 〈몫〉의 주인공 ‘희영’을 통해서는 민족 문제, 계급투쟁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루던 대학교 교지편집부에서 꿋꿋이 교수 성희롱 문제, 아내 폭력 문제, 미국 기지촌 문제 등 여성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그녀’의 이야기를 펼쳐낸다. 〈일 년 후〉에서는 여직원은 많지만, 여성 임원은 적은 직장에서 늦깎이 여성 인턴과 보기 드문 여성 팀장으로 만난 ‘그녀’들―지수와 다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답신〉에서는 가정폭력이 만연한 가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또 다른 남성과의 결혼이라는 도피밖에 없었던 언니와 이를 마음속으로 심판하던 여동생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파종〉에서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녀(민주)’와 그녀의 ‘딸(소라)’의 관계가 전면에 등장하고 〈이모에게〉에서는 홀로 살며 집안의 식모 아닌 식모로 살아온 숙희 이모의 사연을 들려준다. 소설집의 마지막 작품인 〈사라지는, 사라지지 않는〉은 여섯째 딸로 태어나 아홉 살에 헐값에 남의 집 식모로 팔려 갔던, 그리고 지금은 잘나가는 딸에게 부끄러운 얼룩으로 취급받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룬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 주변에 비가시화된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 엄혹하다거나, 그들의 현실을 동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둥 ‘판단’하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되려 저자는 판단은 너무 쉽다며, 이 책의 주인공들을 ‘그런 쉬운 방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217쪽)’고 말한다. 작가의 말을 곱씹는다. ‘기억하는 일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증명하는 행동(33쪽)’이라는 말을.
추석 명절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는 명절에 만났던 이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피가 섞인 친인척의 소식, 얼굴만 마주치며 지나가는 우리 주위 사람들의 현실에 관심을 가진 적이 언제인가. 무심히 지나친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때로는 스트레스이고, 노동이고, 피곤한 일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린 마음의 틈으로 상처를 입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그런 “상처로 빛이 들어오는 기분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빛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빛(43쪽)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대화와 소통이 사라진 시대,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라고들 한다. 작가는 이런 시대에 균열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의 작은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자신이 이 사회에서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바라온 유일한 것(349쪽)’이었다고 말한다. 다음 명절에는 이번 추석에 못다한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틈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 틈 사이로 들어온 빛이 우리가 함께 살아갈 길을 비춰 밝히도록 하자.


